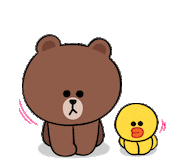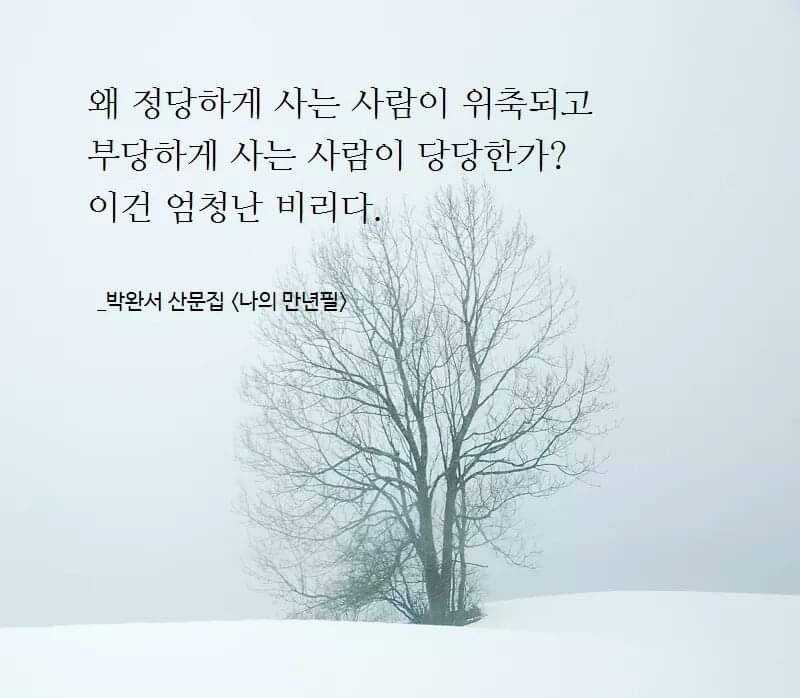롤 모델이 될만한 어른이 부족했던 시절에 내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어 지금의 길로 인도한 고3 시절의 담임.
온기가 부족했던 시절에 그의 따뜻한 말은 내게 마르지 않는 동기를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 나는 하루하루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스승이 한 명 쯤 있듯 그와 같은 선생이 되어야 겠다고 다짐했던 순간이 많았다.
약간의 혼란이 온 것은 졸업한 지 한참이 지난 후였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알고보니 그가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촌지를 받았었다는 것이다.
어떨 때는 돈으로, 또 어떨 때는 고급 양주로
또 어떤 학부모님들로 부터는 호텔 숙박권까지 받았었다라는 전말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야 교권이 사교육보다 학문적, 입시적 권위가 높았던 때라 학교 선생님의 지도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랬었을 것이다.
더 비싼 돈으로 사교육을 시킬 바에야, 주기적으로 담임께 인사(?)를 하는 것이 자식들을 위한
관례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순간 부터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우선 처음에는 일종의 인지부조화를 겪었는데, 개인적인 감정과 사회윤리적인 기준의 충돌이 그것이다.
단순한 이야기로 '목적이 옳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는가?'라는 질문이다.
즉, 그 담임 선생님으로 인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지저분해도 되냐는 것이다.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은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렇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을 빼놓고 일직선상에서 두 개의 문제를 동일하게 고려해 볼 때 생기는 문제들과도 같다.
차분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촌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 그 시대의 풍습을
지금의 기준과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어찌보면 현대인이 신석기인들을 비웃는 셈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김영란법을 포함한 법리적인 규제와 전반적 사회 인식이 그것을 용인하느냐의 문제를 벗어나 확고히 도적적, 윤리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촌지'문화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며, 교육을 병들게 하는 악습임을 대부분의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이렇게 일정한 의견과 이해로 대부분의 주류 문화 인식을 이룬 상태를 우리는 '패러다임'이라 부른다.
이것이 지속되어 뿌리 내리면 '상식'이라는 부를 것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나는 질문한다.
그 때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였듯
지금 우리는 완전한가?
이러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아래와 같아진다.
십수년 뒤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만한 교육의 악습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학부모, 교사, 학생,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식에 현재 자리 잡지 못해 몇 년 뒤면 수면 위로 드러날 악습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중에 악습으로 밝혀지게 될 그러한 관습들은 현재 무엇일까?
알고 보면 악습은 인간사회가 진화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혹은 증거이기도 한 것이 아닐까?
미리 알고 없앤다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러한 악습으로 인해 현재의 더 나은 우리가 된 것은 아닐까?
핑계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명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돈'의 단위로 분류하는 사업자들만 드글드글한 이 부산의 사교육 시장에서
미소의 탈을 쓰고 매달 단물을 빼먹다, 원생이 고학년이 될수록 뒷전으로 보내버리는 이 탐욕의 보습학원 시장을
비난하기에 나 또한 그 그늘에서 녹을 받아먹은 것이 많고,
그 관행을 고발하기에 이 업종을 이끌어간 이들에게 빚이 많다.
그러나 적어도 고등부가 된다고, 그리하여 미래 자산의 가치가 없다고 고2, 고3이 될수록 학생들을
뒷전으로 보내는 것은 정말이지 왜 부산이 입시에서 전국 꼴찌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입시 정보를 가지고 흥정을 하거나, (그 또한 적확한 정보도 아니다.) 제대로 된 체계도 없으나, 무조건 맡겨 달라고 한다거나 등,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내가 근무했던 사교육 환경이란 대부분 이러한 것이었으며, 결국 보다 개선되리라 믿었던 마지막으로 근무지 학원까지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현재 진행되는 악습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기 전까지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본디 악습이란 특정 집단에게 이윤이 되고, 그 이윤은 또 그 집단의 경쟁 우위를 촉발하므로
우선 '나'부터 개선해 나간다 하더라도 부산의 사교육 환경 전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나는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살아 남기 위해 학생들을 팔아야 하다니...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참된 교육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나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와 환경을 온전히 학생의 발전을 위해 쏟도록 하고, 그 뒤는.... 뭐 알아서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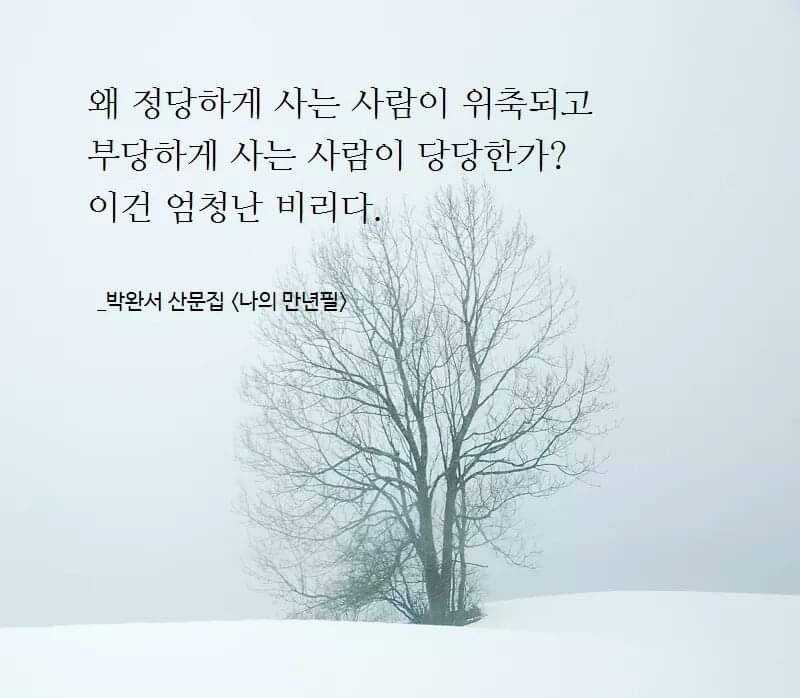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세상은 '정의'롭기를 원한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 학부모의 자녀를 나는 교육할 수 없다.
그것은 '폄하'가 아니라 '상이'이다.
이기적 본질을 지니되 치우치지 않고, 이타적 성향의 학생들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업에 있어 내 남은 이기심 중 하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것이다.